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god shot ; Perfect, devine espresso s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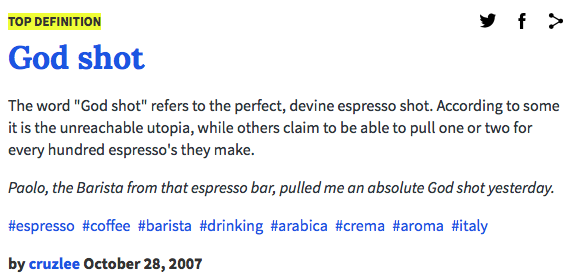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인생커피라고들 한다. 인생에 있어 나올까 말까, 만나볼까 말까 한 '커피 한 잔'이려나. 추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최적의, 최고의 추출을 할 것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사람으로서도 한 번 만나 볼까 말까 한 운명 같은 커피.
커피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인생커피' 덕분에 이쪽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어쩐지 나는 크나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그러지 못했으니까. 내 경험을 들추어 보아도 어딘지 인생커피와는 전혀 동 떨어진 삶을 살아온 것만 같아 한 없이 부끄럽기만 하다. 하지만 이 또한 인생커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측면이 아닐까!
자, 이번 글의 주제는 바로 그 '인생커피'다.

커피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적이 언제였더라.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기 시작하자 '맥심'이 떠오른다. 그래! 아버지는 블랙커피를 즐겼었다. 정확히는 맥심이 아니다. '테이스터스 초이스'(Taster's choice)의 커피 분말 가루. 아버지는 커다란 물컵에 분말 커피를 세 티스푼 정도 덜어내고는 뜨거운 물을 부었다. 그리고 아무런 것도 넣지 않고 묵묵히 커피를 드셨었다. 그게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커피다. 괜히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몇 번인가를 시도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야 말았다. 내가 겨우 그 취향을 이해하는 데는 꼬박 10년이 넘게 걸렸으니까. 그래도 간혹 머리가 찡할 정도로 설탕을 많이 때려 붓고 나서야 마실 수 있기는 했다. 그래 봐야 한 두 모금이지만.
이후 해마다 여름이면 맥심을 두 개 건 세 개 건 타 넣고 얼음도 송송, 달달한 아이스커피를 초고농축으로 만들어 먹고는 했다. 으레 '너 그러다 머리 나빠진다'는 소리도 꽤나 들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카스와 커피를 마셔댔으니 지금의 이 모양이 되어버린 걸까? (하.. 어?......) 쓰다 보니 이게 내 인생커피 인가 싶은데 어째 커피인 여러분들은 제 인생커피를 '아이스 맥심'으로 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학창 시절과 성인을 통틀어 커피라고는 네스카페나 레쓰비의 캔 음료가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겨우 한 두 번, 숙취로 인해, 피곤하니까 따위의 핑계를 들어 사 먹었으니까. 어쩌면 카페에 대한 공포증이 작용한 탓도 클지 모르겠다. 어느 날인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보자!"라는 충동이 들어 카페를 들어갔지만 대체 무얼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자괴감에 빠져있어야 했으니까. 크고 검은 메뉴판에는 흰색의 분필 글씨로 무어라 쓰여있었지만 대체 뭔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는 바로 그 기분, 분명 쓰여있는 건 한글인데 앞뒤 정황이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무척이나 힘들었던 기억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랄까, 나는 몇 번의 주문 실패를 겪고 나서 그리고 혼자 약간의 공부를 한 끝에 카페에서 몇 가지 종류를 주문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쩐지 자주 가지는 않았다. 한창 내가 술에 취해 있던 시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어쨌거나 숙취엔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더블샷 크림'이 진리라는 사실만이 내 몸에 아로새겨져 있으니까. 숙취와 피로를 날려버리는 재충전 음료와도 같은 '스벅 더블샷 크림'. 간혹 지방 출장을 가는 날엔 차 안에 꼭 4캔 정도가 비축되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

본격적으로 커피 업계에 뛰어들기 전까지 나는 수많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남들과 같이 전전긍긍하며 다녔다. 마땅히 시간을 때울 장소가 없으니까, 흔히 눈에 보이니까. 후에 기억을 돌이켜 보니 대학로 '학림'도 자주 갔었더랬다.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무슨 커피를 주문했는지, 그 날의 맛은 어땠는지, 거짓말 같이 하나도 기억에 없으니 거 참......
에스프레소에 관한 재밌는 기억도 있다. 남자의 커피라는 소문을 귀담아듣고는 어느 산장 카페에서 자신 있게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이내 시무룩해진 경험. 어째 남자의 커피 치고는 내어온 양은 개미 눈곱 같아 적잖이 실망을 크게 했었다. 게다가 무슨 맛이 이러한지. (아마도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 추출이 아니었겠죠? 제발 그렇게 말해줘요!)
커피는 확실히 이전과 달리 기호식품으로서의 자리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다. 예전엔 밥 한 번 먹자는 말로 온갖 미식기행을 해야만 했는데 지금은 간단한 커피 한 잔으로 상대방과의 농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문득 지금의 시간을 돌이켜 보니 내가 커피를 업으로 삼고, 또 그 산업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니 시간이 많이 흐르긴 흘렀다. 다양한 커피의 흐름 가운데서 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커피에 열광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성격 때문이랄까 내가 쉬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아버리거나, 이해가 될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거나, 둘 중 하나는 확실하기 때문이다.
유명한 로스터리 샵, 로드샵, 뭐뭐뭐뭐......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가볼만한 곳은 많지만 애석하게도 하나같이 추천을 받아서 간 카페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들의 커핑 스코어가 어떻다고 해도 내겐 그리 공감되지도 않았고, 더욱이 그들은 즐거워 보였지만 나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즐거움을 나에게 강요하고 있었고, 내가 '그거 별로 즐겁진 않네요'라는 말에 당혹스러움을 드러내지만 애써 침착하게 '그래? 근데 이게 우리들 사이에서는 즐거운 게 맞는 거야'라는 식이었다. 그게 끝이었다. 물론 이후에 나올 이야기에는 이러한 경험을 산산이 박살 내는 일화가 있으니 벌써부터 주먹을 말아 쥐진 마시라!

어쩌면 하나 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저 신기했다. 그래도 그들을 존중한다. 다만 기술과 기능의 측면에서 그들이 더욱 집중한 것이고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브랜딩의 측면에서 조금 소홀했다고, 그게 나나 당신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길이라 믿기 시작하니까 더 궁금해지고 더 찾고 싶어 졌다.
나는 인생커피를 찾을 것이다. 부산에 위치한 '오늘도 커피 볶는 집'에서 택배로 주문했던 '멕시코 치아파스'를 핸드드립으로 내가 내려 마신 적이 있다. 음, 괜찮은 데가 아니라 진한 다크 초콜릿의 묵직함이 정말 좋았다. 마찬가지로 분당 율동공원 뒤에 위치한 '180 로스터스'에서 샀었던 '과테말라 안티구아 우라뿌'에서는 정말이지 밀크 초콜릿 향이 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커피업계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커피가 무언지 나는 여전히 몸으로 체득하지 못한 채, 또 인생커피를 찾고 있다.
'커피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작은 카페를 찾는 이유에 대해 (0) | 2019.06.11 |
|---|---|
| 제게 취향을 강요하지 마세요 (0) | 2019.06.10 |
| 철학 없는 킨포크(kinfolk) 철학 좇기 (0) | 2019.06.10 |
| 바리스타란 무엇일까 (0) | 2019.06.09 |
| 어째서 커피 그리고 컨셉일까 (0) | 2019.06.06 |




